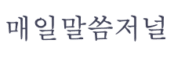2025년, 청년이 줄어든다는 말은 더 이상 수사나 전망이 아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0.65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이는 단순한 인구 문제를 넘어 사회 시스템 전반의 위기를 예고한다. 일본은 이미 청년보다 고령 인구가 두 배를 넘어섰고, 중국도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유럽과 북미 일부 지역도 마찬가지다. 청년층 인구 감소는 전 세계적 흐름이며, 각국은 이를 재정, 국방, 산업, 문화 등 모든 분야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위기는 단순히 인구 수의 문제가 아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사회 전체가 ‘다음 세대’를 위해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청년이 줄어드는 현상은 그 자체로 현상이 아니라 결과다. 결혼과 출산이 삶의 선택지에서 멀어진 것은 단지 돈이 없거나 집이 없어서가 아니다.
미래를 설계할 수 없고, 책임을 지는 일이 손해라는 판단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다음 세대를 꿈꾸는 일은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다. 주거 불안, 불완전 고용, 경쟁 위주의 교육 구조, 돌봄의 공공성 부재, 정치에 대한 불신, 관계의 단절 등 수많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메시지로 수렴된다. “이 사회는 다음 세대를 품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청년이 줄어드는 사회는 곧 희망이 줄어드는 사회다. 인구는 수치이지만, 그 수치 안에는 관계, 연대, 의미, 계획, 기억, 계승 같은 공동체의 기반이 담겨 있다.
청년이 줄어들면 단순히 노동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문화를 새로 만들고, 저항하고, 질문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동력이 약화된다. 청년은 에너지이자 생명력이며, 단순한 나이 구간이 아니라 사회적 중심축이다. 이들이 사라지면 국가의 형태는 유지될 수 있으나, 온기는 식어간다.
대책은 있지만, 많지 않다. 대부분의 정책은 출산을 독려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세금을 감면하는 식의 접근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전제를 간과하고 있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살기 위한 기본 조건’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살만한 사회’를 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 이전에 회복해야 할 것은 신뢰이며, 출산 장려금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회가 삶의 가능성을 어떻게 확장시켜줄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복이다. 청년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청년이 머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않는 한 수치는 계속 하락할 것이다.
무너지고 있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다. 청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기대할 수 있는 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 시대는 청년이 사회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청년을 오래전부터 방치해온 결과를 마주하고 있는 중이다.
오늘의 선택은 20년 후의 인구로 나타나고, 오늘의 방치는 30년 후의 국가 구조로 되돌아온다. 이 흐름을 되돌리려면 청년을 다시 구조 안으로 초대해야 한다. 비로소 그곳에 미래가 담길 수 있다.
사라지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다
청년이 줄어드는 사회는 관계가 줄어들고, 기억이 단절되며, 미래가 약해진다. 다음 세대를 설계할 수 없는 사회는 그 자체로 정체되며, 경쟁력 이전에 생명력을 잃어버린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청년 인구를 늘리는 방법이 아니라, 청년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구조다.
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사회에 사람이 남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다. 이 위기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 구조적 전환점이다.
단지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다. 지금 이 사회가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없다면, 그 누구도 미래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작성자: 이시온 | 매일말씀저널